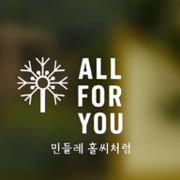-
목차
폭염 속에 방치된 마당 개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동물권과 공감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폭염의 하루, 개는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올여름 가장 더웠던 날, 기온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쿨링포그와 아이스커피, 냉방기구가 일상을 지켜주었지만, 불과 20분 거리의 시골 마을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을 돌자, 철제 대문 옆 마당에 짧은 줄에 묶인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개는 숨을 몰아쉬며 헥헥거리기만 했습니다. 물을 담아 둔 플라스틱 통은 이미 더위에 증발했는지 바닥이 말라 있었고, 낡은 개집은 햇볕에 달궈져 오히려 피신처가 아닌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벌리고 호흡만 반복하는 개를 보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이 개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아니 앞으로 며칠을 더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비건의 시선은 식단을 넘어, 우리 일상 속 무심한 방치와 구조적 학대를 성찰하는 렌즈입니다.

35도 폭염 속, 묶인 개의 하루를 지켜보다: 방치된 생명에 대한 기록 ‘폭염 속 생명권’이 없는 존재들
사람을 위한 ‘폭염 경보’는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쿨링 쉼터, 냉방비 지원, 거리 그늘막이 설치되고, 공공시설도 연장 운영됩니다. 반면, 야외에 묶인 동물들에겐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개는 땀샘이 발바닥에만 있어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특히 짧은 목줄에 묶인 채 콘크리트 바닥에 노출된 개는 심각한 열사병, 호흡곤란, 화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마당개들의 폭염 폐사 사례가 언론 보도로 이어지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그저 “몰랐다” “방금 물 줬는데” “원래 저런 데서 컸다”는 말로 넘깁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동물학대입니다. 비건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일상화된 학대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이야말로 사회가 변화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늘도 없이, 바람도 없이
그날의 마당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5도 더위 속, 시멘트 바닥은 직사광선에 달궈져 50도에 가까운 표면 온도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발을 디디며 버티는 개는 도망칠 곳도, 누울 곳도 없이 그 자리에 묶인 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작은 개집이 있었지만, 내부는 더운 공기가 갇혀 오히려 ‘찜질방’에 가까운 환경이었습니다. 입으로 헐떡이며 체온을 내리는 데 급급한 그 개는, 더는 짖지도 않았습니다. 짖을 힘조차 없거나, 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동물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윤리적 태도입니다. 비건의 길 위에 있는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가?”
단속과 제도는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줄 길이 제한’, ‘폭염 방치 시 과태료’ 같은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시골 마당 개들에게까지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답은 대부분 “아니요”입니다. 법이 존재해도 현장 단속은 인력 부족, 인식 부족,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내 소유’라는 이유로 외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단속 공무원도 “어디까지가 방치인지 애매하다”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생명은 침묵 속에 갇혀 갑니다. 비건 실천자들이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개들은 계속 무관심 속의 고통을 정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 그릇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당신이 마주친 그 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작고 단순합니다.
- 지나가며 물을 한 그릇 채워주는 것
- 그늘막 하나 만들어주는 것
- 주인에게 “물은 자주 주고 계시죠?”라고 조심스레 묻는 것
- 가까운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에 상담 문의를 남겨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 개에게는 **폭염 속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변화는 큰 제도 이전에, 한 사람의 시선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인간의 구조물과 사회 속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폭염 속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35도, 인간도 숨이 턱 막히는 날씨 속에서 묶여 있던 그 개의 하루는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아마도 기억조차 희미한 생존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루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그 생명이 느끼는 고통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건 실천은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 어떤 생명을 외면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동네, 당신의 골목에도 그 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하루가 단지 ‘참는 시간’이 아닌, 누군가의 관심으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m 밖의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대인가 문화인가? 전통 속 동물인식의 진실 (0) 2025.09.27 기후 재난에 묶인 생명: 산불과 폭우 속 개들의 참혹한 죽음 (0) 2025.09.26 우리 집 앞의 진실, 1m 개는 무엇을 느낄까 (0) 2025.09.24 ‘마당에서 뛰어노니 행복하다’? 시골 개의 삶에 대한 오해와 진실 (0) 2025.09.23 반려견과 방치견의 경계선, 우리는 언제 외면했을까 (0) 2025.09.22
민들레 홀씨
건강, 환경, 윤리적 소비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