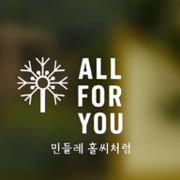-
목차
마당에 묶인 개의 고통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무뎌지는 걸까? 죄책감 없는 방치의 심리, 그 무감각의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죄책감 없는 방치, 정말 무관심일까?
많은 사람들은 1m 줄에 묶인 개를 보며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온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혹은 ‘저런 개는 원래 저렇게 키우는 거지’라는 관습적 인식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감정의 문제이자 학습의 결과입니다. 개를 방치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으면, 그것은 죄책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생명에 대해 감각하지 못하는 사회는, 죄책감조차 사라진 ‘구조적 외면’을 만들어냅니다.
무감각은 반복된 노출의 결과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습관화(habituation)"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된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그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둔화된다는 뜻입니다. 마당에 묶인 개를 매일같이 보며 자란 이들에게, 그 모습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고통은 공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반복된 노출은 감정을 마비시키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비정상적인 현실이 '일상'이 되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생명의 고통에 침묵하게 됩니다.

왜 방치하면서도 죄책감은 없을까: 무감각의 메커니즘 정당화의 언어: “어쩔 수 없었다”, “다 그렇게 키운다”
방치된 개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쓰이는 말은 “시골에선 다 그래”, “개는 원래 밖에서 키우는 거야”입니다. 이런 언어는 책임을 회피하고 죄책감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정당화는 무책임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의 고통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인간 중심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에 무비판적으로 익숙해질수록, 방치의 현실은 더욱 고착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된 사회,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거리 좁히기: 눈을 돌리지 않는 연습
죄책감은 회피의 감정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개를 볼 때 드는 불편함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감정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행동입니다. 무감각을 깨는 첫걸음은, 단순히 눈을 돌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건 실천자에게 던지는 질문
비건은 생명을 바라보는 감수성의 확장입니다. 그렇다면 묶여 있는 개를 지나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고기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비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비건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방치된 생명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그 감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윤리적 민감성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런 거지”라는 말로 외면했던 순간들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무감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감각을 잃지 않는 당신의 시선이, 변화를 만듭니다.
'1m 밖의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보호법은 1m 줄에 묶인 개를 보호할 수 있을까? (0) 2025.10.01 비건 실천자라면 마주해야 할 거리: 1m 줄 끝의 생명 (0) 2025.09.30 ‘개 짖는다’는 이유로 묶인 개, 정당한가? 방해가 아닌 언어로서의 짖음 (0) 2025.09.28 학대인가 문화인가? 전통 속 동물인식의 진실 (0) 2025.09.27 기후 재난에 묶인 생명: 산불과 폭우 속 개들의 참혹한 죽음 (0) 2025.09.26
민들레 홀씨
건강, 환경, 윤리적 소비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고민합니다